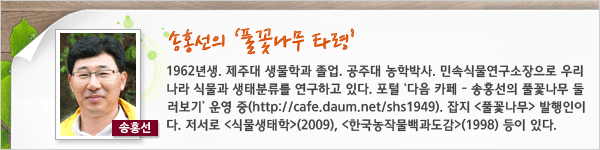[송홍선의 ‘풀꽃나무 타령’ 17]
삐삐, 삘기 등으로 불리던 식물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새’라고도 칭하던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현재 우리말의 식물명으로는 ‘띠’라 부르며 1m 정도 높이로 자란다. 뿌리에서 돋는 잎은 칼집처럼 줄기를 감싸고 어긋나게 달린다.
5~6월에 흰빛의 솜털모양으로 꽃을 피우며 솜털모양의 꽃은 열매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퍼진다.
지금이 7월이므로 흰빛의 솜털이 아름답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흔히 꽃이 피기 전 통통하게 알밴 모양을 하는 꽃의 어린 순을 삐삐라고 불렀다. 삐삐는 아이들이 즐겨 먹었다. 제주도에서는 식물체 전체를 ‘새’라고 했으나 먹을 수 있는 꽃의 어린 순은 따로 ‘삥이’라고 불렀다. 삐삐는 입안에 넣으면 녹아버릴 정도로 연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번에 삐삐를 많이 따 까서 먹었다. 하지만 삐삐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질리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삐삐가 나오는 계절이 되면 가까운 산비탈을 돌아다니며 삐삐를 한 움큼 뽑았다. 물론 먹는 재미와 함께 뽑는 재미도 있었던 삐삐뽑기는 즐거운 놀이이기도 했다. 누가 더 많이 뽑았는지 누구 것이 더 큰 지가 승패를 좌우했다. 그런 것이 아이들에겐 재미난 놀이였다. 삐삐를 많이 뽑지 못한 아이들은 괜히 기가 죽기도 했다.
많이 뽑은 아이들은 큰 삐삐만 빼놓고 자잘한 것들을 많이 뽑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때 삐삐를 받은 아이들은 게임이 진 사람처럼 풀이 죽었다. 삐삐는 내기놀이뿐 아니라 그저 심심풀이로 뿌리를 캐서 씹어 먹기도 했던 간식거리였다. 삐삐 뿌리는 이뇨제, 요도염, 지혈제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한방과 민간에서 열나고 갈증이 있을 때 푹 삶아 우려낸 물을 마기도 했다.
띠는 제주도에서는 무척 요긴하게 쓰인 풀이었다. 띠의 잎으로 짚신을 만들고, 밧줄을 만들어 지붕을 묶고 엮어 지붕을 이기도 했다. 양파눌(양파를 모아놓은 주저리)이나 촐눌(가축의 먹이를 쌓아놓은 주저리) 등에도 이용했다.
제주도에서 띠는 ‘생활 문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풀이었다. 초가지붕은 모두 이것으로 엮었다. 띠는 한라산 중턱에 널려 있었지만 워낙 쓰임이 많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밭에 심어 기르기도 했다. 대부분 지붕을 이는데 쓰기 위함이었다.
제주도 이외의 고장에서도 띠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널리 활용됐지만 제주도에서 만큼 다양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띠는 지붕 이외에 자리를 친다거나 도롱이를 엮는다거나 풍채, 뜸 등을 만들었다. 띠자리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거의 전 지역에서 고르게 사용했다.
띠자리는 경남 함양지방에서는 이 자리를 깔고 낳으면 아이에게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이것을 깔았다. 또 전북 남원 지방에서는 배석자리를 이 띠로 엮기도 했다. 띠는 이처럼 다양한 생활공간뿐 아니라 신성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도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올 때 쓰는 도롱이는 부들, 볏짚이나 보릿짚 따위로 엮었으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띠이다. 제주도에서는 이전에 집을 지을 때에 흙질이라 하여 벽에 붙일 흙을 물과 함께 반죽했는데, 이때 띠는 꼭 필요한 재료였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아직도 마당에 보릿짚이나 띠를 가득 카페트처럼 깔아놓고 있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래저래 띠와 함께한 삶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띠의 이용을 핑계로 필자의 고향이야기를 부질없이 늘어놓아 보았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