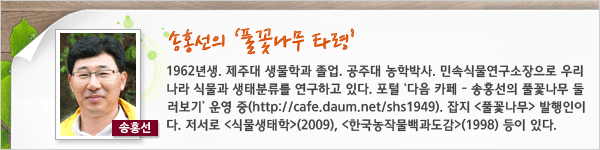[송홍선의 ‘풀꽃나무 타령’ 43]
목화는 아욱과(무궁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이다. 잎은 어긋나며 잎자루가 길다. 꽃은 8∼9월에 핀다. 어린 열매는 다래나무의 녹색 열매와 비슷하다. 때문에 목화의 어린 열매를 흔히 ‘다래’라 불렀다. 아이들이 즐겨 따먹었다. 목화송이가 터지기 전 푸르스름한 열매는 맛있었다. 이빨로 깨물면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물이 터져 나왔다.

먹고 싶은 열매를 딸 때는 잘 골라서 연한 것을 따야 했다. 그래도 먹지 못하는 열매를 따게 되면 아깝지만 버렸다. 열매는 점차 성숙해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하얀 솜이 터져 나온다. 너무도 하얀 나머지 멀리서도 목화밭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목화송이가 활짝 벌어진 목화밭은 흰빛의 아름다운 꽃이 핀 꽃밭처럼 보였다. 하얀 목화송이만 있지만 보는 이의 눈을 지루하지 않게 했다. ‘꽃은 목화꽃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목화꽃과 목화송이는 무척 아름다웠다.
뭉게뭉게 터져 나온 묵화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문학 작품에 나오는 구름이 목화송이에 곧잘 비유됐다. 이 비유는 목화밭이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양떼 같은 구름’으로 바뀌었지만.
한반도는 목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의류와 복식의 역사에 일대혁신을 일으켰다. 백성은 부해지고, 국력은 강해졌다. 목화가 한반도에 들어온 때는 고려시대이다. 고려 말에 문익점이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 3개를 붓두껍 속에 숨겨서 고국에 돌아와 산청군 달성면의 집 뜰에 심은 것이 점차 전 지역으로 퍼졌다.

오늘날에도 목화 시배지(始培地)인 산청과 의성에서는 해마다 가을철에 목화제를 올리고 문익점 일가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시배지는 고적 제154호로 지정돼 있다.
목화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옷감으로 명주(明紬,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천연 단백질 섬유 및 명주실로 짠 천을 통틀어 일컫는 말), 비단(緋緞, 명주 가운데 특유의 광택을 띠는 천), 갈포(葛布, 칡의 섬유로 짠 천), 모피(毛皮, 짐승의 털가죽) 등이 주원료였기 때문에 누에치기와 뽕밭가꾸기가 아주 성행했다.
그러나 목화가 들어오면서부터 뽕밭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갈포와 모피도 목화에 의해 밀려났다. 그리고 목화 역시 영원토록 한반도에 유용한 자원으로 남지 못하고 목화수입과 카시밀론 등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
한반도에서 목화밭이 거의 사라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소년소녀들은 목화밭을 오가면서 ‘우리 처음 만난 곳은 목화밭이라네/ 우리 서로 헤어진 곳은 목화밭이라네…’하는 노래를 불렀다.
조금씩 목화밭을 가꾸면서 그 맥을 이었다. 그러나 카시밀론 이불이 값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목화재배는 우리 곁에서 거의 볼 수 없게 사라지고 말았다.

한반도의 목화는 늦은 봄에 심어 열매가 익으면 피어나는 송이를 따서 물레로 실을 뽑아 베메기해 씨줄을 두루마리에 감아서 베틀에 걸고 짜냈다. 농가의 길쌈은 모두가 부녀자의 차지였다. 목화밭 김매기도 부녀자와 아녀자들이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했다. 당시에 모든 직포와 의류 생산은 부녀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씨앗은 금화자(錦花子)라 하며, 그것으로 짜낸 기름은 면실유(綿實油) 또는 흑유(黑油)라고 하여 공업용, 약용으로 이용했다. 등잔 기름으로도 썼다.
한방에서는 목화를 초면이라고도 했으며, 그 뿌리를 흑피포라고 하여 토막토막 분질러서 염료나 악성 부스럼인 악창의 치료제나 진통제로 썼다. 목화는 그밖에도 탈지면, 면사, 붕대의 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