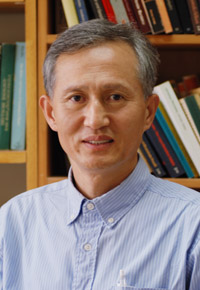
옛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 전 헌책방에서 이 책의 완역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산 일이 있다.
실제 현실에서 슬프게 하는 것들이 반가울 리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삶속에서 종종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곤 한다.
최근 남·북간 긴장의 고조도 나에게는 슬픈 일들에 속한다. 분단이 된지 반세기가 훨씬 넘은지라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도 무감각해진 것 같다. 이미 여러 번 학습효과를 거쳤기에 다수 국민들은 위기상황에 익숙해진 탓일까. 아니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고달파서 나와 직결되지 않은 군사적 긴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도 여기에서 예외이지 않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할 때면,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생기곤 한다. 현지 매스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접하는 착잡함, 또 외국 지인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몇 년 전 베를린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천안함 사태로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듯이 연이어 보도했었다. 베를린대학 동료교수는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사건의 진상에 더 관심이 많았다. 내 자신이 현실적 위험에 많이 무감각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험사회 연구의 권위자 독일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가 수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말이 생각난다. 즉 ‘한국은 너무 위험이 만연되어 있어서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고위험사회’라는 것이다. 무딘 무감각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현실문제에 대한 깨어있는 정신이 올바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타율적 분단을 경험했던 국가여서인지 독일의 지인들은 한국의 분단 상황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평화적 통일이 한 순간 갑자기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긴 해빙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서독 분단 당시 양쪽 국민들의 왕래가 가능했다거나, 주변국을 설득하고 부단한 대화와 노력의 결과가 평화통일로 이어졌다는 사실 등은 그들의 성숙한 자세를 엿보게 한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평화를 위한 목표와 현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아직도 타율적으로 우리의 통일이 가로막혀 있듯이 남북 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적의(敵意)는 한없이 가파르다. 이런 상황에서는 드라마틱한 반전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극 그 자체이리라. 몇 일전 대화사상가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전기 <마르틴 부버>가 우연히 내 손에 들어왔다. 참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임을 되새겨 본다.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현재의 ‘나와 그것’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성숙한 의식을 갖는데 정치인, 국민을 가를 수는 없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반전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