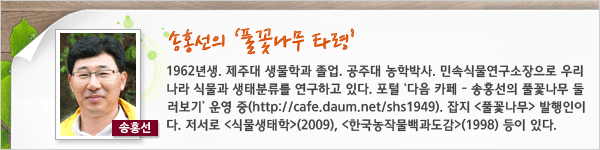이름의 유래는 크고 길게 자라 위로 향하는 잎이 부들부들 부드러운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강화도 등에서는 ‘부득이’라 하고, 백령도 등에서는 ‘잘포’ 또는 ‘갈포’라고 한다. 한자로는 향포(香蒲), 포초(蒲草), 포황(蒲黃) 등으로 쓴다.
한반도 거의 전 지역의 연못 또는 논 주변의 도랑이나 물가에 흔하게 자라는 풀이다. 때문에 부들이 무성하게 자란 논둑을 특별히 부들방죽이라 부르기도 했다.

연못이나 논둑에 자라는 풀
일찍 나오는 부들의 새싹은 날것으로 먹었는가 하면 만주지방에서는 대나무 어린 순의 대용으로 몇몇 요리에 넣었다. 특히 부들의 수꽃 꽃가루를 햇빛에 말린 것은 포황이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했다.
포황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꽃이 막 피어나는 6월말과 7월초 사이에 채집한다. 너무 이르면 수꽃이 성숙하지 않고, 너무 늦으면 꽃가루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철저히 건조시킨 후에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건조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좋다. 덩어리가 지거나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포황은 노란색의 꽃가루로서 바람에 잘 날리고 물에 뜨며, 만지면 부드럽고 매끄럽다. 손에 묻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냄새도 없고 먹어 보면 쓰지도 달지도 않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지혈과 어혈을 푸는 것으로 여겨 여러 방면의 약재로 쓰고 있다. 민간에서는 보통 5~10g의 포황을 헝겊 주머니에 넣어 달인 것을 먹는다. 또한 혀가 부을 때 꽃가루를 혀에 뿌리면 부기가 가라앉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부들의 암꽃 이삭은 완전히 성숙하면 흐트러져 솜같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둘둘 뭉쳐 침구 속에 넣어 솜으로 대용했다. 상처의 지혈제로 많이 쓰기도 했고, 그 이삭을 말려 불을 붙여 양초 또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
도롱이, 짚신 등 생활용품 재료로
이밖에도 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됐다. 부들은 환경조건만 좋으면 사람의 키만큼 높이 자라기 때문에 그 잎은 생활용구의 뜸, 도롱이, 짚신, 부채 등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널리 쓰였다.
뜸은 비올 때의 물건을 덮거나 햇빛을 가리고 무엇을 널어 말릴 때에 깔개로 쓴 것인데, 주로 볏짚이나 밀짚으로 엮었지만 지역에 따라 띠(삘기) 또는 부들로도 만들었다. 비올 때 우산 구실을 하는 도롱이는 띠, 짚, 부들 등을 재료로 많이 엮었다. 부들짚신은 부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신을 말하며, 부채는 대오리가 주로 사용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짚, 왕골, 부들 등의 식물로도 만들었다.
그밖에 ‘늘삿갓’은 부들의 잎줄기로 결은 삿갓을 일컫는데, 갈대를 재료로 하여 만든 ‘길삿갓’과 구별해 부르는 이름이다. 특히 부들의 잎줄기는 약간 질기고 탄력성이 있어 가내 가구 등은 물론 방석이나 돗자리로 많이 만들어 썼다. 돗자리는 《삼국사기》에 수레를 대발과 완초(莞草)로 꾸몄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삼국 시대부터 부들이나 왕골 등으로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부들의 잎줄기를 이용해 방석이나 돗자리를 짜는 일이 늘었단다. 이는 부들로 만든 자리를 포석(蒲席)이나 부들자리 또는 늘자리라 하고, 이것으로 만든 방석을 포단(蒲團)이라 하여 드물게 시판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부들도 이용가치가 많다는 이야기다. 무릇 부들의 이용가치가 이것뿐이겠는가.